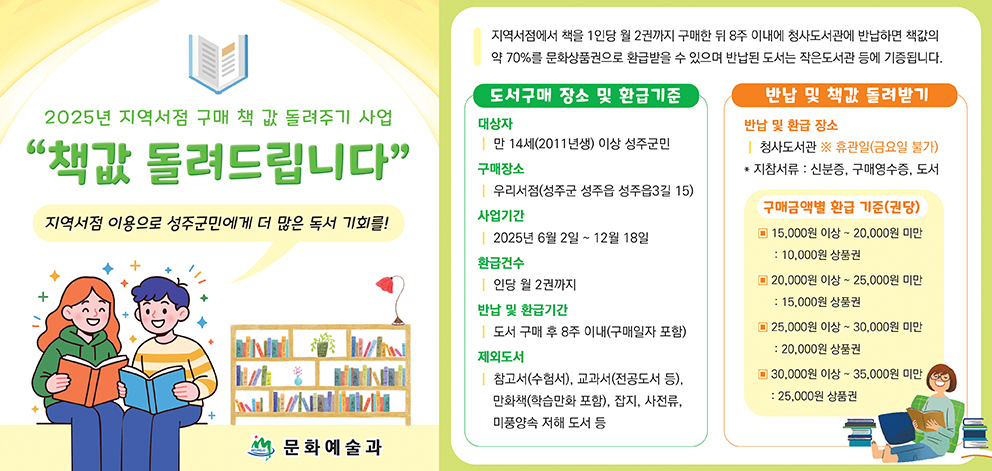|
 |
|
| ↑↑ 최 필 동
수필가 |
| ⓒ 성주신문 |
|
고향을 말할 때마다 그 못지않게 맘을 설레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함께 놀며 자랐던 친구 숙 얘기다. 이럴 때 흔히들 죽마고우, 백아절현 등으로 통칭은 하지만 여기서는 이 죽마고우를 쓸 수가 없다. 그것은 그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열대여섯 살이나 됐던 때에 이 친구를 만났으니 아마도 그때가 이른바 사춘기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 통념에서 보는 무슨 구애를 할 수 있는 타성 간의 관계는 아니었으므로 오히려 더욱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특히나 그가 당내친은 넘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족친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사실 타성이었다면 그 사춘기 시절 연정을 품음즉도 했지만 '언감생심'이어서 내 스스로 계명(戒名) 같은 것에 억눌리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지금에야 실토한다. 다시 말해, 금기를 어기더라도 분명 프러포즈를 감행했을 만큼 내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친구야! 너 이 말을 듣고 제발 웃어넘기기 바란다. 어쩌면 철부지라 해도 좋다.
6·25 전후일 때여서 고루한 남녀칠세부동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남녀유별이 한 도덕률로 자리하고 있을 때이니 오늘날과 같은 무한 개방의 시대는 아니었다. 여성을 친구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가이니까 친구라는 개념으로 정말 가깝게 지냈던 것이다. 교회도 함께 다녔으니 더욱 그랬을 것이다.
세월은 흘러 모두 성년이 되었다. 그는 결혼하여 가버렸고 나는 생업 따라 서울로 와버렸으니 이후 흐른 세월이 60여 년이었다. 무슨 애틋한 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못내 헤어지기 섭섭한 연모의 정이 있었던 건 더욱 아니었다. 사실 그럴 새도 없이 그는 결혼해 가버렸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후의 세월동안 강산이 여섯 번이나 변하도록 잊고 있었다. 그러다 소식을 알게 됐으니 내가 그걸 덧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허허로운 '자기학대'일 뿐이었다.
누구나 살아가다 우연히 만나는 것을 해후라 하지만 나는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의도적 만남(?)이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그의 연락처를 알고 언제든 대구 가면 한번 만나리라 하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대구 갈 일이 생겼다. 용무를 끝내고 전화를 했더니 비록 기계음으로 듣는 음성이지만 반색이 역력했다.
알려준 택시 내릴 지점에 내렸더니 나보다 먼저 와 기다리다 맞아주는 것이었다. 그것도, 많은 세월에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변했을 터이니 내리는 사람마다 아무개 아니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도 그랬고 나도, 그냥 지나쳐도 모를 만큼 변했다고 하며 거의 동시에 환히 웃었다.
60여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아련할 줄 알았지만 서로 반가움에 마치 어제 만났다 헤어져 오늘 다시 만나는 듯했다. 그도 나도 다 늙었지만 답지 않게 정말 순진무구한, 어쩌면 천진했을 지도 모를 웃음이 절로 나왔다. 내 늙은 것은 생각 않고, 그 곱던 얼굴에 생긴 주름이 못내 아쉬움으로 다가옴을, 여성이니까 내색은 할 수 없어 웃음으로만 얼버무렸다.
인생의 주름살! 그 의미는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생리적 자연 현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걸 초월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누구나 나름으로는 살아온 풍상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통상이지만 그는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옛날 같으면 주름도 아닐 만큼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한 때 서로 맘을 알 만큼의 친구라서 그런 것만은 분명 아니었다. 오늘의 세태는 늙어가는 자연 현상을 인위적으로 거부하려는(보톡스) 부류도 많다. 하지만 그는 그런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자연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자연미(自然美)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일러라. 60여 년 만에 만났으니 오죽 할 말이 많았을까. 아무래도 화제는 자식 얘기였다. 4남매를 키웠는데 미국생활 하는 박사 아들, 대기업 다니는 사위·딸도 있다고 했다. 그러다 친정 얘기로 돌아갔다.
할아버지(최우동·崔羽東 1871-1939))는 성주 유림에서 다 아는 학자라고 했다. 반감(飯監·조선시대 궁중 음식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할 만큼 손님도 많이 들었다고도 했다. 거기다 내가 아는 바를 좀 더 보탰다. 백운동 동네 어귀 바위에 '백운동천 구로회'라 새기고 거기 9명의 인사 중 최우동 어른이 있다고 알려 주기도 했다. 특기할 것은 이분 사후 묘지명을 거유 김창숙 선생이 썼다는 것으로 그 명성을 알게 하고도 남는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덧붙이자면 구로회는 중국 당나라 백낙천이 노인 9명과 함께 회동했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는 것도 내가 최우동 선조의 행적을 찾다보니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과 말은 그 뜻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다. 글은 어제도 오늘도, 누가 봐도 그 본래의 의미에 갇혀 있지만 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 쉴 사이 없이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무슨 헛말이거나 인사치례의 말은 없었다. 모두 오롯한 정을 실어 진지한 말을 주고받았다. 그게 모두 순수한 인간관계이며 마음을 연 정겨운 말들이었다. 한참 얘기하다 '아제 딸들은 예쁘제'라는 그 말 속에는 그의 순수함을 모두 담고 있어서 순후한 인품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앞서 말한 교회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는 그 어렵던 시절 중학교도 중퇴했고, 그래서 자연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주위에서는 '제는 책만 본다'라는 말도 들었다. 그래서 식견이 늘어나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 본인 말마따나 보고 싶어도 볼 책이 없으니 글자 박힌 종이나부랭이는 다 주워 읽었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지금도 자녀들이 사다 준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본다고 했다. 사실 나도 터놓고 말하면, 옛날 서울 남산에 책만 읽고 살았던 가난한 선비를 이르는 '남산골 샌님'이었지만 좋게 말하면 호학(好學)했으니 자연 그와는 이럴 때나 쓰는 유유상종이 제격이었다.
그날은 너무 할 얘기가 많아 그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 숨 가쁘게 쏟아 냈지만 서너 시간이 그렇게 짧은 줄은 처음 알았다. 그래서 오늘 못다 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이만 쓴다. 고맙다, 숙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