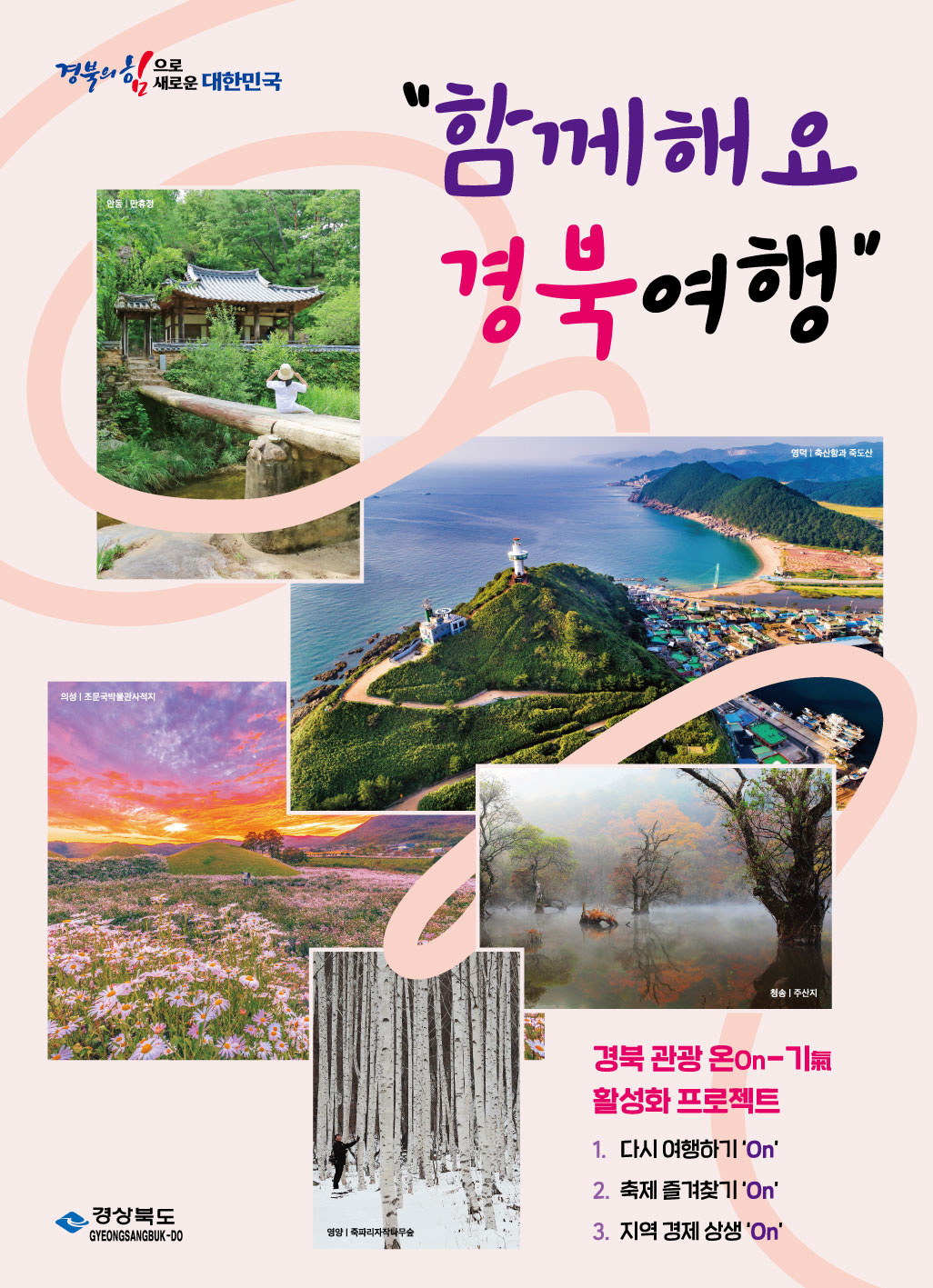|
 |
|
| ↑↑ 최 필 동
수필가 |
| ⓒ 성주신문 |
|
(1018호-꽃이 싫어(1)에서 이어집니다.)
시인묵객이 읊고 노래하고 그려내는 한 연원이 꽃이다. 그런데 명색이 문사(文士)가 되려는 내게 글쓰기의 한 밑 자료가 되는 꽃이 싫어졌다. 꽃이 싫어졌으니 '꽃 피고 새 우는 계절'을 제대로 그려낼 수도 없다. 글쓰기에서 묘사가 없으니 마치 총 없는 병사와 같게 됐다. 그래서 나는 꽃이 더 싫어졌다. 그런 내게 꽃 얘기는 그게 마지막이었다.
싫으면 그냥 싫어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런 구차한 변명을 대는 걸까? 양귀비 같은 그 자태나 활짝 핀 꽃웃음 뒤에는 왠지 모를 절절히 바라는 음험한 시도가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편리하게도 이성(Logos)과 성애(Eros)를 구분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예 이성이니 뭐니 하는 그 말 자체가 싫다.
팔색조와 공작새는 왜 그렇게 황홀한 깃을 세워 누굴 유혹하려는가? 휘황찬란한 깃을 세운 새에다 벌 나비가 덮씌우니 악! 소리가 날 지경이다. 상상도 싫어 고개를 저어 눈을 감아도 그 악마 같은 운우(雲雨)와 화간엽무(花間葉舞)는 마수가 되어 나를 내리친다.
내 딸애는 외국 시민권 얻으려 10여 년을 거기 살다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돌아왔다. 화단에 핀 오이꽃만은 못해도, 비록 방년은 지났어도 아직은 요조(窈窕)인데, 날아들 벌 나비 없으니 내 애를 태운다. 날아드는 벌 나비는 줄어든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 많이 피는 꽃들은 그냥 시들어 가야만 하는가. 깊이 사유할 것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세태는 혼밥·혼술도 오히려 미화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누굴 원망해야 하나?
사람들은 여인을 꽃으로 의인화한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 의인화의 여인들은 오랫동안 '감춤'의 미덕이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노출'이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넘쳐나는 거리의 오고 가는 여인들을 보면 이를 더욱 부인할 길이 없다.
여인은 맨 발등도 보이면 안 되는 지난 날 조신(操身)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른바 'S스타일'의 그 적나라한 노출이 일상이다. 그 '무엇무엇'을 선뜻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두들 '볼륨(volume)'이라 쉽게 말한다. 그 외래어가 양감(量感)이니 S스타일의 '어디어디'를 우리말로는 차마 쓸 수가 없다. 말하기기도 민망한 에로티시즘이 어른거리니 '말'이 아니라 '글자'로만 쓸 수밖에 없다. 참 아이러니다.
치마 길이 재던 과다 노출의 시대는 진작 가버렸고, 이제는 기다렸다는 듯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그 볼륨의 시대와 함께 레깅스도, 스키니진도 거리에 넘쳐난다. 돌아온 내 딸애도 다르지 않다. 아침저녁 눈을 둘 데가 없어 외면하기 시작했다. 자식 미워하는 좀팽이가 돼버렸다. 정녕 그러고 싶진 않.지만 온몸의 자태는 애써 피하고 활짝 펴버린 얼굴만 대하기로 했다. 그러려니 더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자식 예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만 사실 그 애는 어설픈 자화자찬이지만 좀 예쁘긴 했었다. 그땐 사진관업이 대중적인 사업체였으며 거기서 애 돌 사진을 찍었다. 그들 눈에 예쁘게 보였던지 쇼 케이스에 진열이 됐고, 이를 본 친지가 알려오기도 했던 애였다.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 되겠지만 여고 시절 당시 KBS '비바청춘'에 출연도 했는데 그 PD가, 연예계 진출하고 싶으면 길 열어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던 애였다. 또 발제자 대여섯 명 가운데 한명으로 뽑히기도 했으며, 출연극 고조선의 공무도하가에서는 여주인공 여옥의 역을 맡기도 했었다.
내 딸이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라며 이목구비가 더욱 선명해지니 주위로부터 예쁘다는 소릴 듣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신의 자태를 볼 수도 없고 얼굴만 봐야 하니, 어디 비유할 데도 없이 이리도 가슴만 엔다. 애연(哀然)함만 안고 살아야 하는 아비가 되고 말았다.
고문이 따로 없다.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것은 마치 '개미가 소대가리 흔들려는 격'일 수밖에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 해야 하나. 꽃이 피었다 제 몫을 다 못 하면 스러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지만 그 꽃들이 야속하게도 내 딸애에 자꾸 오버랩이 되니, 그걸 피할 수도 없는 압박감이 되어 더욱 가슴을 후벼 판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자식으로 태어나면 곱게 성장해 반려자를 찾고 가정이라는 울을 꾸려, 살아가는 규범에 따라 길흉화복을 다 누리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이치이다. 그게 효도였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혼 안 하는 효도는 차라리 과거의 한 유산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굴종(屈從)적 발상도 하게 했다.
제 할일 다 못 하고 '반쪽'만 사는 딸애를 봐야 하는 게 내겐 견딜 수 없는 강박이다. 이 풍요의 문명사회가 진정 이런 것인가 하니 참 허허롭다. 나 같은 '보꼴'이 이런 부적응의 세태를 감당해야 하니 그게 더 괴롭고 슬프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딸애 너덧 살이나 됐을 때 '츈향뎐'도 읽었던 제 할머니 글 가르친다고 '키스'를 따라하라 했지만 '키슈'라 반복하니 '아이고, 그것도 못 하면서 장래 커서 뭐될래!'라고 해서 폭소를 불렀던 애였었다. 그 연세에 듣도 보도 못 한 영어를 하라 하니 그럴 수밖에 더 있는가.
또 중3이나 됐을 때는 어느 날 전화로 '아버님…' 하는 남학생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 통념으로는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미처 말할 새도 없이 내가 너무 놀라니 그 학생이 먼저 전화를 끊었던 일도 있었다.
그땐 이 애는 결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 보니, 가슴을 칠(?) 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뒤늦은 후회만 하고 있다. 인생살이 역(逆) 새옹지마가 돼버리고 말았으니 말이다.
만인이 다 좋아하는 꽃, 나도 좋아한다. 그러나 내 집에 함께 사는 '80년대생 꽃'은 그럴 수도 없으니 그 이율배반의 고행을 어찌 감당하며, 빈 하늘만 하염없이 봐야 하는 일은 언제 끝이나 날까? (끝)